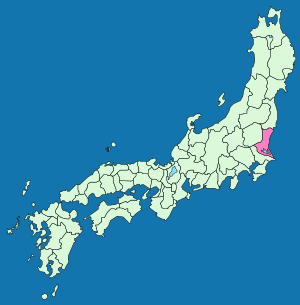1.에도의 정치
에도성 ~ 1657년 이래 에도성 천수각은 없었다.시대극의 에도성은 새빨간 가짜
이에야스는 1590년 에도에 들어가 오오타 도칸이 지은 에도성에 입성했다.
장군에 취임하자 대명들을 동원하여 본격적으로 에도성 건설에 착수한다. 공사는 3대 장군 이에미츠때까지 단속적으로 시행되었다.
애초에 혼마루에는 금으로 된 샤치호코(머리는 호랑이 몸은 물고기)를 얹은 동기와지붕에 흑옻칠을 한 화려한 5층짜리 천수각이었으나 1657년 대화재로 소실된뒤 재건되지 않았다.
시대극에서는 에도성대신 히메지성 천수각을 쓰고 있는데 실은 1657년 이래 에도성천수각은 없었다.
막부 ~ 도쿠가와 영지는 전국 영지의 1/4
武家의 정부. 柳営라고도 한다.
장군가의 직할지는 400만석,
쿄토, 오사카, 나가사키, 사도등의 주요도사와 무역도시, 금광등을 직할하였다.
하타모토(장군 직속 가신)령이 300만석이었고
막부의 재정은 일개 봉건 영주 자격으로서 도쿠가와가의 재정으로 부담하였으나
비상시에는 국역을 칭하여 전국의 대명들로부터 석고에 맞춰 상납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막부는 대명(다이묘)의 영지를 바꾸는 転封,이나 영지를 빼앗는 改易등의 권한이 있었으나 에도시대 중기이후에 자의적인 전봉의 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다.
쇼군(장군) ~ 신장군은 우에사마, 선하를 지나면 쿠보사마
막부의 주권자로 형식적으로는 조정으로부터 임명받는다.
정확히는 정이대장군(征夷大将軍)으로 정2품에 해당하며
내대신, 겐씨의 장남등에도 임명된다.
장군을 결정하는 것은 막부였으나 조정내에 陳儀하는 의식을 행하여 将軍宣下(천황이 장군을 임명하는 선지를 내림)를 내려 칙사를 파견하여 이를 알렸다.
막부에서도 새 장군을 우에사마(上樣)라고 칭하고
천황에게 임명을 받은 뒤 쿠보사마(公方樣)라고 칭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조정의 절차를 존중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종가의 혈통이 끊어지면 御三家나 御三卿에서 상속한다.
어삼가/어삼경(御三家・御三卿)
코산케(御三家,어삼가)는 이에야스의 9남 요시나오를 시조로 하는 오와리家,
10남 요리노부의 키슈家,
11남 요리후사의 미토家를 말함.
오와리가와 키슈가는 다이나곤, 미토가는 쥬나곤까지 승진하여 다이묘중에서 제일 격이 높았다.
미토코몬으로 유명한 미츠쿠니는 미토가의 2대 당주로 黃門은 쥬나곤의 당나라 관직명이었다.
고산쿄(御三卿)어삼경은 8대 요시무네의 차남 무네타케를 시조로 하는 다야스家(도련님 동심 류노스케의 가문ㅋㅋ),
4남 무네타다의 히토시바츠家(공작등롱에서 하나타로가 사칭한 가문ㅎㅎ),
9대 이에시게의 차남 시게요시(重好)의 키요미즈家이다.
고산쿄(御三卿) 는 에도 시대 중반기에 갈라진 도쿠가와 가문의 일족이다.
도쿠가와 쇼군가와 고산케의 혈연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우려한
8대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자신의 아들 둘을 분가시킨 것이 고산쿄의 유래이다.
쇼군의 후계자를 제공하는 것은 고산케와 동일하나
따로 영지를 받지 않고 막부의 봉록을 받으며 에도에 거주하는 점이 다르다.
고산쿄 목록
- 다야스 도쿠가와家(田安徳川家)
- 시조는 도쿠가와 무네타케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차남)
- 히토쓰바시 도쿠가와家(一橋徳川家)
- 시조는 도쿠가와 무네타다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4남)
- 시미즈 도쿠가와家(清水徳川家) =키요미즈가
- 시조는 도쿠가와 시게요시(9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시게의 차남)
***키요미즈테라 [Kiyomizu Temple, 淸水寺 ( 청수사 )] 는 일본 교토부 [ 京都府 ] 남부에 있는 절이다
에도 시대 고산쿄 당주 명단
[편집] 다야스家
- 무네타케 (1716년-1771년, 재임. 1731년-1771년)
- 하루아키 (1753년-1774년, 재임. 1771년-1774년)
- 나리마사 (1779년-1846년, 재임. 1787년-1836년)
- 나리타카 (1810년-1845년, 재임. 1836년-1839년)
- 요시노리 (1828년-1876년, 재임. 1839년-1863년)
- 다카치요 (1860년-1865년, 재임. 1863년-1865년)
- 고멘노스케 (1863년-1940년, 재임. 1865년-1868년) : 도쿠가와 종가 제16대 당주
- 요시노리 (재취임) (1828년-1876년, 재임. 1868년-1876년)
[편집] 히토쓰바시家
- 무네타다 (1721년-1765년, 재임. 1735년-1764년)
- 하루사다 (1751년-1827년, 재임. 1764년-1799년) : 11대 쇼군 이에나리의 아버지
- 나리아쓰 (1780년-1816년, 재임. 1799년-1816년)
- 나리노리 (1803년-1830년, 재임. 1816년-1830년)
- 나리쿠라 (1818년-1837년, 재임. 1830년-1837년)
- 요시마사 (1825년-1838년, 재임. 1837년-1838년)
- 요시나가 (1823년-1847년, 재임. 1838년-1847년)
- 쇼마루 (1846년-1847년, 재임. 1847년)
- 요시노부 (1837년-1913년, 재임. 1847년-1866년) : 15대 쇼군으로 취임.
- 모치나가 (1831년-1884년, 재임. 1866년-1884년)
[편집] 시미즈家
**

도쿠가와 요시토시 (德川好敏)
1884년 7월 24일 생 - 1963년 4월 17일 사망
도쿄에서 시미즈 도쿠가와 가문(淸水德川家-도쿠가와씨의 일족)의 당주로 태어난 도쿠가와 요시토시는 메이지 유신이후, 화족(華族)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가세가 기울자 아버지가 화족의 지위를 반납했다.
1903년에 육군사관학교 제 15기를 졸업한 도쿠가와 요시토시는 공병과에 배속된 후 1909년에 대위로 승진했다.
1910년에 비행기 조종술을 익히기 위해 프랑스로 파견된 도쿠가와는 12월에 일본으로 귀국하여
12월 14일에 요요기 연병장에서 비행모습 실연을 위해 참석했다.
이때, 활주시험 중이던 히노 쿠마조(日野熊藏) 육군보병대위가 60m 정도의 비행에 성공했다.
이것은 일본 최초의 동력기비행이었다. 그러나 일본군 상부는 <활주시험 중 우연히 날아오른 것으로는 비행이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히노의 비행성공을 무시했다.
다음날인 15일에 도쿠가와 요시토시가 비공개로 실행한 비행시험에서 실패하고
히노 쿠마조(日野熊藏)는 성공했지만 이것도 인정되지 못했다.
더우기 16일에도 히노는 단독비행에 성공했지만 역시 인정되지 못했다.
12월 19일이 되어서야 도쿠가와와 히노의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성공하자
이것이 처음으로 <일본최초의 동력기 첫 비행>이라고 공식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도쿠가와 가문의 혈족인 요시토시에게
<일본 최초의 비행>이라는 영예를 안겨주기 위한 군 상부의 배려였다고 한다.
그러나 히노의 비행이 성공했을 때 가장 기뻐한 사람은 다름아닌 도쿠가와 요시토시 대위였다.
1911년 비행기에서의 공중사진 촬영에 성공한 요시토시는
이후 항공병과가 신설되자 육군항공학교 교관, 항공병단장, 항공병단 사령관이 되었다.
1928년에 도쿠가와 요시토시는 일본육군 항공병 부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전의 화족 지위를 되찾아 남작(男爵)작위가 수여되었다.
이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군을 물러났던 도쿠가와는 중일전쟁 이후 다시 소집되어 육군항공사관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종전 후 퇴역하여 1963년에 사망했다. 최종계급은 중장이었다.

도쿠가와가 일본 최초의 비행에 사용했던 프랑스제 복엽기인 앙리 페르만 (Henri Farman)
후계자를 고르는 것은 현직 장군이나
그렇지 못했던 7대 이에츠구의 사후 8대 장군은 6대 장군의 정실 텐에이인의 의사가 결정적이었다.
15대 요시노부는 이에모찌의 사후 종가상속을 요청받자 상속은 하지만 장군직에는 오르지않겠다고 대답했다. 이 시기에는 종가를 상속받아도 장군이 되지않는 선택지가 있을 법하다고 생각되지만 결국은 장군직에 올랐기에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겠다.
타이로(大老)
에도막부의 정무를 총괄하는 최고직. 늘 두던 관직은 아니고 임명할 경우에는 한 명이었다.
로쥬(老中)
통상적으로 에도막부의 정무를 통괄하는 최고직으로
와카토시요리(若年寄)의 보좌를 받아 일상정무를 집행한다. 3대 장군 이에미츠기의 전반까지는 토시요리라고 불렀다. 3~5인정도가 임명되어 월번제로 업무를 보지만 결정시에는 합의를 했다.
장군을 섬기는 혼마루 로쥬와 오고쇼 또는 세자를 모시는 니시마루 로쥬의 2종류가 있으나 통상 로쥬라고 하면 혼마루 로쥬를 말한다.
소바요닌(側用人) ~ 가부키로 유명한 요시야스는 정말 악인인가
장군 측근의 최고직. 장군을 보좌하며 장군과 로쥬를 연결하는 직책.
5대 장군 요시츠나의 소바요닌 야나기사와 요시야스는 천하를 취하려고한 악역으로 가부키나 강담에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별난 정책을 펼친 요시츠나의 측근이었기에 욕을 먹었고 요시츠나가 몇번이나 그의 집을 방문하였기에 다이묘들은 막부에 뭔가 탄원할 일이 있을 때 로쥬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서찰을 보냈기에 권력을 지닌 것도 사실이긴해도 그가 자의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8대 요시무네때 폐지되고 오소바고요토리츠기가 대신 신설되었으나
9대 이에시게때 와카토시요리인 오오츠카 타다미츠가 소바요닌으로 임명되면서 부활하였다. 타다미츠는 말이 명료하지 않았던 이에시게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한다.
10대 이에하루때의 타누마 오키츠구는 로쥬면서 소바요닌을 겸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오소바고요토리츠기(御側御用取次)
소바요닌이 부활한 후에도 존속되어 막말까지 유지되었다.
로쥬는 직접 장군에게 진언하는 것도 가능하긴 했지만 보통은 이 사람이 중개를 하였기에 단순한 연락역외에 권력도 지니게 되었다. 로쥬의 신청도 내용에 따라서 중개없이는 딱지를 맞기도 했다.
생물을 가련히 여기는 법률 ~ 개에 대한 법령이라는 것은 큰 오해
5대 장군 츠나요시가 시행한 개를 함부로 죽이면 벌을 받게 한 법률...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 대상이 개뿐 아니라 조류, 어류, 소 말부터 버려진 아기까지 다양한 생물에 대한 것이다. 또 류코우라는 중이 츠나요시가 개띠이므로 개를 소중히해야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권했다는 설은 류코우가 츠나요시를 만나기 이전에 법령이 발표된 것이 밝혀졌다.
막부의 정치 제도
참근교대(参勤交代 さんきんこうたい) ~ 다이묘의 경제력저하가 목적이 아니다
모든 다이묘들이 격년으로 영지에서 장군이 있는 에도에 가는 제도.
이의 원형은 토요토미 시대로 올라간다. 복속시킨 다이묘에게 처자를 상경시키게해 쿄토와 후시미에 저택을 지어 거주시켰다.
이에야스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권을 쥐자 참근을 하는 다이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사카의 진'후에 참근교대제가 실질적으로 확립되었다.
3대 이에미츠는 무가제법도에 동서 다이묘의 격년 4월 참근을 명기하여 다이묘를 통제하는 막부의 제일 중요한 제도로 완성시켰다.
이 제도가 다이묘의 경제력을 소모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고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모든 다이묘들에 대한 복속의식임이 본질이다.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행렬을 지어 가도를 왕래하면 지방경제가 진흥되고 일본전국의 균질화가 이루어졌다. 또 다이묘의 서열화가 이루어져 그에 따른 의례도 정비되는 한편 에도에 체재하는 다이묘들끼리도 교류가 왕성해졌다.
1862년 막부는 3년에 1번으로 변경했고 다이묘의 처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이후 참근교대제는 유명무실해졌고 대정봉환을 하면서 종언을 고했다.
하타모토/고케닌(旗本・御家人)
1만석 미만의 장군 직신으로 御目見得以上(직접 장군을 배알할 수 있음)의 직책을 하타모토, 이하를 고케닌이라고 하였다.
하타모토는 약 5천명. 고케닌은 약 만육천명정도였다.
대개 하타모토는 100석이상의 지행(녹봉)을, 고케닌은 100俵이하의 蔵米(저장미)를 받았다.
하나모토중에서 3천석이상 또는 상급직책에 근무한 자와 그 적자는 寄合(보직이 없는 상급 하타모토)라고 하고, 참근교대를 하는 녹봉이 높은 자를 交代寄合라고 하였다.
마치부교(町奉行)
町奉行所의 장관. 절, 신사지역과 무가지역을 제외한 에도의 행정담당자로 마치부레(町触)라는 법령을 발표하고 경찰과 사법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소방이나 재해구조도 하였다. 남북 각 한 사람씩 있어서 한달씩 교대로 근무하였다.
녹봉은 3천석. 임기가 따로 없으나 2,3년에서 5,6년정도가 보통이었다.
8대 요시무네 시절의 마치부교 오오카 타다스케(大岡越前守忠相)는 20년간 근무하면서 물가대책, 소방과 양생소설치등의 업적을 이루고 1만석까지 녹봉이 늘어 지샤부교(寺社奉行)까지 승진하였다. 그러나 가부키나 강담, 시대극등에 묘사되는 명재판은 다른 부교가 담당했던 사건이나 중국의 고사에 기반을 둔 픽션이 대부분이다. '遠山の金さん'으로 알려진 토야마 사에몬노죠가케모토(遠山左衛門尉影元)의 사쿠라후부키(桜吹雪;바람에 눈보라처럼 흩날리는 벚꽃) 문신이 유명한데 실제로는 막 자른 여자의 목 문신으로 젊은 객기로 이런 문신을 한 것을 부끄러워해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한다.
지샤부교(寺社奉行) ~ 오오쿠 여관(女官)와 승려의 스캔들도 단죄했다
전국의 종교통제와 절, 신사에 속한 땅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며 소샤방(奏者番 무가에 관한 의식이나 의전에 관한 일을 보는 요직)의 상급자가 겸임했다. 하리마노쿠니 타츠노 번주(播磨国龍野藩主) 와키사카 야스타다(脇坂安董)가 맡은 사건중에 오오쿠의 여관의 스캔달인 엔메인(延命院) 사건이 있다. 엔메인은 에도 타니나카에 있는 안산기원으로 유명한 절로 주지인 日潤이 대신 참배하러온 오오쿠 여관과 밀통하여 임신한 여자에게는 낙태약을 건넨 사실이 적발되었다. 야스타다는 가신의 딸을 밀정으로 하여 연애편지를 증거로 체포하는데 성공하여 日潤은 사형을 당하였다. 그에게 걸려들은 여자들은 59명에 이른다고 하나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꺼려 오오쿠의 여관들의 처벌은 소소했다.
2.다이묘의 종류와 서열
다이묘(大名) ~ 토쿠가와가와의 관계로 서열이 결정된다
장군 직신(직속부하)중에 1만석이상의 지행(녹봉)을 받은 무사. 막부볍령에는 만석이상이라고도 되어있다.
다이묘의 의무는 받은 지행지(녹봉을 거둬들이는 땅)를 다스리는 것과 참근교대를 하는 것이었다. 1만석이상의 지행을 갖고있더라도 큰 번의 가로처럼 장군의 직신이 아니면 다이묘로 임명되지 못헀고 참근교대도 할 필요가 없었다.
다이묘의 분가면서 장군의 오메미에이고 직신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지번주(支藩主)가 된다. 이 경우 新田藩이라고 하며 독립된 영지는 아니고, 지행치만큼의 연공미만을 받는 지번주도 있었다.
다이묘는 토쿠가와가와의 혈연관계나 따른 시기에 따라 親蕃, 外樣大名, 譜代大名으로 크게 나뉘고 영지나 성의 유무에 따라 国主, 準국주, 城主, 성주格, 無성등의 서열이 있었다. 또 조정으로부터 받은 관위나 에도성에서의 控席에 따라서도 격식이 달랐다.
친번(신반,親藩)
토쿠가와가문 다이묘의 총칭. 에도시대에는 신반이라고 부르지 않고 격식에 맞춰
어삼가, 어삼경,
가문(카몬,家門), 연지(렌시,連枝)이라고 불렀다.
가문에는 이에야스의 차남 히데야스를 시조로 하는 에치젠家와 그 분가들,
2대 히에타다의 아들 호시나 마사유키(保科正之)를 시조로 하는 아이즈 마츠다이라家등이 있다.
히데야스의 아들 타다나오는 菊 池寛의 '忠直卿行状記'에서도 알려져있듯이 행실이 나쁜 관계로 분고(豊後)에 유배되고 적자 미츠나가는 훈고타카다로 영지를 이전당했으며 동생 타다마사가 40만석을 받아 에치젠가라고 칭했다. 그뒤 미츠나가는 후계자 문제인 에치젠소동으로 인해 개역(영지를 몰수하는 형벌)을 받으나 양자인 노부토미가 가문재건을 허가받아 츠야먀번이 성립되었다.
후다이 다이묘(譜代大名)
세키가하라 전투 이전부터 토쿠가와가를 받들던 만석이상의 직신.
석고는 필두인 이이(井伊)가가 30만석이나 대부분 10만석이하였다.
이이가는 타이로를 배출하는 가문으로 타마리노마(溜間)에 특별히 모셔졌다.
유서있는 후다이 다이묘는 테이칸노마(帝鑑間)에 대기석이 준비되었고
그외의 후다이 다이묘는 카리노마(雁間)와 키쿠노마(菊間)의 툇마루에 자리가 마련되었다.
카리노마의 다이묘는 츠메슈(詰集)라고 불렸고 로쥬등의 막부중추의 요직에 임명되었다.
그래서 이 방의 다이묘들을 오야쿠케(御役家)라고도 하였다.
토자마 다이묘(外様大名)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부터 토쿠가와가에 복속된 1만석 이상의 직신. 영지가 큰 다이묘가 많고 그 필두가 카가백만석이라고 하는 마에다가였다. 그 다음이 시마즈가, 다테가등이 있었다.
이들중 위계가 종4위하이상은 오오히로마(大広間),
종5위하의 다이묘는 야나기노마(柳間)에 자리를 배정받았다.
오오히로마의 다이묘는 쿠니모치다이묘(国持)로 1국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영지를 소유했다. 쿠니모치 다이묘는 높은 격식을 허가받았으나 막부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없었다
마에다가만은 큰 복도에 면한 방을 배정받았다.
시마즈가도 시게히데의 딸 시게히메가 11대 장군의 정실이 되면서 큰 복도에 면한 방을 받았다.
타마리노마츠메(溜間詰)
에도성 흑서원에 부속된 타마리노마에 자리를 배정받은 막부고문인 다이묘.
다이묘 관위(大名官位) ~ 다이묘를 실명으로 부르는 것은 실례였다
에도시대의 다이묘들은 막부의 승인을 받아 조정으로부터 관위(관직과 위계)를 받아 관직을 이름으로 썼다.
위계는 서열의 등급으로 일반 다이묘는 종5위하,
20년이상 재임한 다이묘와 쿠니모치 다이묘, 로쥬, 京都所司代등이 종4위하,
시마즈가, 다테가는 종4위하에서 종4위상,
마에다가는 정4위하,
미토가는 종3위,
오와리와 키슈가는 정3위에서 종2위등으로 되어있었다.
다이묘덴세키(大名殿席) 에도성에 등성했을 때 다이묘가 대기하는 방.
어삼가는 소나무의 대복도(松の大廊下)에 면한 방의 윗칸,
마에다가와 에치젠가는 아래칸에 배정받았다.
후다이 다이묘중에 미카와시절부터 토쿠가와가를 섬긴 중신들의 자손은 테이칸노마에 자리를 받았다.
막부성립이후 능력과 공적을 인정받은 다이묘는 카리노마에 자리를 받았다.
이들은 츠메슈라고 불리우며 교대로 등성하여 이 자리에 앉았다.
2만석이하의 무성 다이묘는 키쿠노마 툇마루에 자리를 받아 츠메슈나미(並)라고 불리웠다.
번저(한테이,藩邸)
다이묘들이 에도에 설치한 출장기관. 번저의 토지는 막부가 주고 건물은 다이묘가 지었다. 이를 하이료 야시키(拝領 屋敷)라고 하고 통상 상중하 3개소를 받았다.
보통 카미야시키(上)가 번주의 본저택, 나카야시키가 은거한 번주의 저택, 시모야시키는 광대한 정원을 가진 별장이었다. 토지내에는 어전과 나가야로 나뉘어 어전에는 큰 방과 서원등의 의식을 집행하는 방, 번주의 거실, 정실과 죠츄의 거처가 있는 오쿠등이 있고 나가야에는 번사들이 살았다.
그외에 화재가 났을 때 피난하는 요우진야시키와 물자를 보관하는 죠우야시키(蔵屋敷)도 있었다. 이들을 카카에야시키(抱屋敷)라고 하여 출입하는 상인의 명의로 구입했다.(이게 뭔말이지...)
모리가나 시마즈가처럼 카미야시키가 협소해서 나카야시키나 시모야시키를 번주의 본저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이야시키(居屋敷)로 등록했다.
3.번의 직제
가로(카로우,家老)
번사의 최고직. 老는 연령이 아니라 지위를 표시하는 것으로
페리 입항시의 로쥬 수좌 아베 마사히로는 25세라는 약관의 나이에 로쥬가 되었다.
큰 번에서는 집안의 격이 높은 가문에서 가로를 세습하고 그 아래 급의 상급번사가 봉행을 맡아 정치를 하였다.
가로에는 영지의 정치를 맡은 城代가로와 에도에서 막부와의 교섭을 맡은 에도가로가 있어서 이 둘이 대립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시대극의 한 쟝르로 자리잡았다.
번두/물두(반가시라/모노가시라,番頭・物頭)
번두는 중급번사를 통솔하는 상급가신으로 번의 군사조직의 우두머리이다. 번두에서 가로로 승진하는 자도 있었다. 중급 가신은 보통 우마마와리(馬廻)를 말한다. 번주의 말 주위에 있으면서 번주를 호위하는 역할이다. 번에 따라서는 반가시라 대신 쿠미가시라라고도 했다.
물두(物頭)는 도보로 종군하는 하급무사인 오카치(御徒)와 철포병등의 아시가루(足軽, 보병)급의 하급 가신을 통솔하는 중급 가신이다.
성아래 마을의 행정과 재판을 맡은 쵸부교(町奉行), 또 농촌지배와 연공징수를 맡은 코오리부교(郡奉行)는 물두에서 승진했다.
치교도리/쿠라마이도리(知行取り・蔵米取り)
무사의 수입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치교도리라고 해서 가령 300石이라고 하는 것처럼 코쿠(石)로 표시하는 경우와
쿠라마이도리라고 해서 가령 50俵라고 하는 것처럼 효(俵)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100석을 받는 무사와 100표를 받는 무사는 수입이 거의 비슷한 양이지만
무사는 본래 영지를 지니는 존재이므로 전자가 신분이 높은 것이 된다.
코오리부교
다이묘의 영지는 다이묘 직할지와 가신의 지행지로 구성되어있다.
번의 재정이 궁핍해지자 지방지행제에서 봉록지행제로 변화해가기 시작했다.
즉, 번이 가신의 영지를 일괄관리하고 가신에게 봉록미만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신 입장에서 봐도 지행지 경영에 비용이 들고 풍흉작 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봉록미를 받는 쪽이 유리한 면이 있었다. 이럴 경우 번의 영지를 일괄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를 담당한 것이 코오리부교이다. 이는 중급 번사중에서 선발하였고 대관을 휘하에 두어 연공수납의 실무를 보았다.
에도 루스이 야쿠(江戸 留守居 役)
다이묘가 에도를 비울 때 에도에 상주하며 막부로부터의 지시를 접수하는 가신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가로 수준의 가신을 체류시켰으나 1624년경부터 중급번사를 근무시켰다.
번의 중역인 가로로는 지시를 따르건 탄원을 하건 막부와 번 사이에 공식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이를 피하기 위해 중급 번사를 상주시키면서 공식적인 절차 이전에 사전작업을 했다. 공식적으로 내리기 힘든 지시를 내리거나 은밀한 청탁을 시키는 등 물밑 교섭을 시켰다.
막부의 법령등은 오메츠케가 루스이야쿠들을 모아놓고 전달했다.
정보수집을 위해 자기들끼리 留守居組合을 만들었는데 에도시대 중기에는 이 집단의 힘이 너무 커져서 다이묘도 이 조직의 승인없이는 루스이야쿠를 교체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에도 근무 무사/아사기 우라(浅葱裏)
근무를 위해 지방에서 에도로 나온 무사.
옷의 안감이 아사기 목면을 사용한 것이 많은데서 유래되어 유곽에서는 놀리는 말로 아사기우라라고 불렀다.
아사기라는 것은 옅은 파 잎색으로 浅黄色라고 쓰기도 했다.
에도의 멋쟁이들은 옷의 안감에 비단을 썼다. 안보이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좋은 취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막부가 상인들의 옷에 비단을 쓰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퍼진 풍속이다.
4.오오쿠와 오오쿠 죠츄(女中)
오오쿠(大奥) ~ 남자금제! 오오쿠 여관에게 공작을 거는 수단이..
에도성내에 있었던 장군의 정실과 측실의 거처. 오오쿠는 장군이 상주하는 나카오쿠(中奥)와 2개의 오스즈노로카(御鈴廊下)로 연결되어있어서 입구는 엄중하게 관리되었다. 오오쿠에는 장군의 별장인 오코자시키(御小座敷), 정실과 측실의 거처, 여관들이 근무하는 방(이상을 고텐무키御殿向라고 한다), 여관들의 숙소인 나가츠보네(長局), 남자 관리들의 숙소인 오히로시키(御広敷)가 있었다. 고텐무키와 나가츠보네는 남자금제였으나 로쥬나 루스이(留守居)는 검사를 하러 들어가곤했고 가족등 9세이하의 남자도 출입이 가능했다. 전담의사도 진찰을 위해 들어갔으므로 다이묘들이 여관들에게 공작을 펼 때에는 이들을 통하곤 했다. 공사나 대청소를 할 때에는 인부들이 들어갔지만 엄중한 감시하에 있어서 여자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
오오쿠죠츄(大奥女中) ~ 근무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신분의 여성뿐
위에서부터 上臈御年寄(죠로오토시요리), 御年寄(오토시요리), 中年寄(쥬도시요리)...유히츠(右筆),..오산노마(御三之間),...의 순으로 오토시요리는 로죠(老女)라고도 하여 제일 톱클래스였다. 죠로오토시요리는 오다이도코로(장군의 부인)을 따라 쿄토에서 온 귀족의 딸로 신분은 높으나 권력은 가지지 못했다. 오산노마 이상은 하타모토의 딸이었다. 죠츄는 오소바(御側)계열과 야쿠닌(役人)계열로 나뉜다. 오소바는 오즈키(御次), 오츄로(御中臈)등으로 장군과 부인의 수발을 들었고 장군의 총애를 받기 쉬웠다. 오토시요리의 문서를 집필하는 유히츠, 오오쿠의 외교와 남자관리와의 절충들 담당하는 오모테츠카이(表使), 오스즈노로카를 감시하는 오죠구치(御錠口)등은 야쿠닌 계열로 순차승진하여 오토시요리가 된다. 오오쿠에는 '一引 二運 三女'라는 말이 있어서 출세를 위해서는 상급자가 끌어주는 것이 필요했다. 나카이(仲居) 이하는 고케닌의 딸로 드물게 상인이나 농부의 딸도 있었다. 그외에 죠츄들이 사적으로 쓰는 헤야가타(部屋方)들도 있어서 상인이나 농부의 딸들이 많이 고용되었다. 헤야가타들은 휴가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행동도 장유라 우에노의 시노바즈노이케(不忍池) 근처의 만남의 찻집(出会茶屋)에서 남자와의 밀회도 하였다.
헤야가타
마타모노(又者)라고도 한다. 이들은 나가츠보네에 배정된 죠츄들의 방에서 동거하며 근무했다. 가령, 로죠의 방에는 10명정도의 헤야가타가 있고 츠보네(局) 한 사람, 소바(側, 아이노마合之間라고도 한다)가 6명, 타몬이 4명정도 있었다. 츠보네는 조정에서는 신분이 높은 여관을 칭하는 말이었으나 오오쿠에서는 헤야가타의 우두머리인 조츄를 가리킨다. 타몬은 물긷기, 밥짓기등의 일을 하는데 아와지방근처에서 신체건강한 여자를 고용했다. 료죠는 친척의 딸을 헤야코(部屋子)로 키워서 오츠기나 오쵸로로 추천했다. 헤야코는 헤야가타들로부터는 아가씨라고 불렸다. 헤야가타중에는 츠보네의 이지메를 못견뎌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미다이도코로(御台所) ~ 처음엔 장식품같은 존재였다
장군의 정실. 주위로부터는 미다이사마라고 불렸다. 2대 히데타다의 정실 오에요(お江与, 아사이 나가마사의 딸)외에는 귀족의 최고 가문인 5대 섭정가인 코노에(近衛), 타카츠카사(鷹司), 큐조(九条), 니죠(二条), 이치죠(一条) 또는 미야가(宮家)인 후시미노미야(伏見宮), 카츠라노미야(桂宮), 아리스가와노미야(有栖川宮), 칸인노미야(閑院宮)등 세습친왕가에서 정실을 들였다.
11대 이에나리는 히토츠바시(一橋)가에 있을 때 혼약을 한 사츠마번주 시마즈 시게히데의 딸 시게히메(타다코)를 정실로 하였다. 다이묘의 딸이 정실이 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으나 형식적으로는 코노에가의 양녀로 들인 다음 맞아들였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13대 이에사다는 3번째의 정실로 시마즈 나리아키라의 양녀 아츠히메(스미코, 후일의 텐쇼인)을 정실로 맞았다. 7대 이에츠구는 영원천황의 황녀 야소노미야 요시코(八十宮吉子)와 혼약했으나 요절했기에 이뤄지지는 않았다. 14대 이에모치는 공무합체정책을 위해 인효천황의 황녀 카즈노미야 치카코(和宮孝子)를 맞았다. 역대의 미다이도코로중 낳은 아이가 장군이 된 경우는 오에요뿐으로 전기의 미다이도코로는 장식품적인 존재였으나 10대 이에하루 이후에는 통상의 부부관계가 있어서 자식을 낳았다.
오헤야사마(お部屋様) ~ 장군의 자식을 낳으면 단숨에 랭크업
장군의 측실을 말함. 5대 츠나요시까지는 교코나 에도의 상인의 딸등 여러 가지 계층에서 골랐다. 아이를 낳으면 오오쿠내에 방을 받았으므로 오헤야사마라고 불리웠다. 츠나요시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둔 오덴(お伝の方)은 오후쿠로사마라고 불리워 독립된 어전을 받아 고노마루사마(五の丸様)라고도 불리웠다. 측실의 친척은 다이묘로 발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에도시대 후기로 들어서면서 측실의 대부분이 오츄로중에서 산택되었고 오츠기등의 다른 죠츄로 장군의 손이 닿은 여자도 오츄로로 승진했다. 그것은 곧 장군의 총애를 받는 것도 오오쿠에서의 '업무'의 하나로 여겨진 것이다. 단지, 장군의 손이 닿아도 오츄로 그대로이지만 아이를 낳으면 오하라사마(御腹様)가 되어 방을 받고 측실이 되었다. 장군에게 성을 가르치는 죠츄가 고나이쇼노카타(御内証之方)로 나온 TV드라마가 있지만 그것은 착오로 이는 장군의 후계자를 낳은 측실의 존칭이다.
5.조정과 천황
천황(天皇)
에도시대의 천황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옹립한 고요우제이(後陽成) 천황을 시작으로 메이지 천황으로 끝나는 16명이 있었다. 메이지 천황은 코우메이(孝明) 천황이 급사하여 19세에 즉위했다. 明正과 後桜町는 여제였다.
천황의 임무는 조정에서 행해야할 여러 가지 의식과 제사를 지내고 공가와 무가의 관위 서임을 재가하는 일이었다.
황후(코우고우,皇后)/중궁(츄우구우,中宮)/여어(뇨우고,女御)
모두 천황의 처를 가리키는 말로 황후에게는 중궁職이라는 관청이 배당되기때문에 중궁이 황후의 별칭으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무로마치시대부터 에도시대 초기까지 중궁은 공석이었다. 천황가쪽에서는 중궁을 두면 관청을 설치해야만하고, 중궁을 배출해야하는 섭정가가 외척으로서 중궁을 원조하는 것이 어려웠던 경제적 이유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본래 그리 지위가 높지 않았던 여어가 황후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히데타다의 딸 마사코(和子)가 고미즈노오 천황의 여어가 된뒤 명정 천황을 낳은 뒤 중궁이 되었다. 이것이 에도시대의 유일한 중궁이었다. 이후 천황들에게는 1천황 1여어가 유지되어 여어가 실질적 황후의 지위에 올랐다.
천황의 측실
천황에게는 여러 명의 여관이 부속되어 이중에 측실도 있었다. 여관에게는 스케(典侍), 나이시(掌侍), 묘우부(命婦)의 관위가 있었다. 각각 7, 4, 7명이었고 묘우부는 천황이 무슨 말을 건네도 직접 답하거나 말을 걸 수 없고 스케나 나이시를 통해서 문답을 했다고한다.
섭가(摂家)/섭관가(摂関家)
군주 대신에 섭정하는 직책을 맡은 섭정이나 관백을 배출하는 가문으로 5가문이 있었다. 헤이안시대에 천황가의 외척으로 섭정 태정대신으로 권세의 극에 달한
후지와라 도죠(藤原道場)의 자손들로 미도류(御堂流)라고 불리웠다.
처음에 코노에가와 큐죠가가 있었고 내려오면서 큐죠가에서 이치죠가와 니죠가가 분리되어 나왔고 코노에가에서 타카츠카사가가 분리되어 총 5개 가문이 되었다.
공가(쿠게, 公家)
공가(귀족)의 최고위는 섭가이고 그 뒤로 세이가(清華)家, 다이진(大臣)家이다. 세이가가는 3공(태정대신, 좌대신, 우대신)에 임명되는 가문으로 코가(久我), 산죠(三条), 西園寺, 徳大寺, 카자노인(花山院), 오이미카도(大炊御門), 菊亭, 히로하타(広幡), 醍醐의 9가문이다. 다이진가는 대신이 되는 가문인데 되더라도 내대신으로 임명되는 즉시 사직하는 관행이었다. (그게 모야) 그외의 가문은 平堂上라고 했고 그중에 3위 이상의 관직에 올라 참의 이상의 관직에 있는 공가를 공경(公卿0이라고 했다. 공가의 관직으로는 대신 아래로 문관은 다이나곤, 츄나곤, 참의가, 무관으로는 대장, 中将, 少将이 있었다.
부케텐소(武家伝奏) ~ 조정의 직책인데 막부가 임명
조정과 막부사이의 교섭을 담당하는 조정의 직책. 정원은 2명으로 공가인데 막부가 임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항시 쿄토쇼시다이와 연락을 취하며 막부의 의향을 조정에 전달하는 임무였으나 조정의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교섭을 하는 것도 이 직책이었다. 조정의 정치는 관백이 하지만 쿄토쇼시다이의 입장에서는 관백은 신분이 높다는 이유로 쉽게 만날 수가 없어서 이 자를 불러 만사를 상담했다.
6.에도의 치안
마치부교쇼(町奉行所)
현재의 동경도청과 경시청에 하급재판소의 기능까지 합친 것과 같은 기관이었다. 남북 2개소였으나 1702~1719년동안에는 中마치부교소가 있어서 3개였다. 남북이라고는 하나 지역으로 담당구역을 나눈 것이 아니라 월번, 즉 1개월 교대로 기소의 창구가 되었고 결정은 남북이 협의하여 내렸다. 단지 상업분야에서는 책, 술, 배등은 북쪽에서 비단, 목면, 약재등은 남쪽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업종에 따라 나누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마치오 선생께선 오류를 범하셨는걸...)
요리키/도우신(与力・同心)
요리키가 남북 각 25기(말을 타고 다녔기에), 도우신이 각 100~120명정도 근무했다. 요리키의 수석은 넨반가타(年番方), 차석이 同心支配, 그 아래로 각각의 계로 나눠졌는데 요리키 전부가 나눠지는게 아니라 능력이 떨어지는 자는 소속이 없었다.
경찰 조직인 산마와리(三廻)는 도우신만으로 이뤄졌다. 隱密廻는 남북 각 2명으로 비밀 탐색을, 죠(定)마와리와 린지(臨時)마와리는 각각 6명씩으로 통상적인 조사와 체포를 하였다. 산마와리 도우신은 도우신중에서도 출세 코스였다. 도우신은 코모노(小者)를 2명씩 거느렸다. 체포시 '御用提灯'을 들고 움직이는 자가 코모노이다. 마치부교의 비서이자 요리키와 도우신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우치요리키(内与力)라 하였다. 요리키의 지행은 보통 200석, 도우신은 30표에 2인의 부하를 거느렸다.
체포(捕り物)
요리키의 지휘하에 도우신이 코모노를 데리고 출동하는데 도우신은 날을 망가뜨린 긴 칼을 허리에 차고 있다가 용의자가 저항하면 이를 뽑아 상대를 공격했다. 요리키는 検使라 하여 보통은 지켜보기만 하였다. 체포는 용의자를 연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시대극에서처럼 칼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용의자를 솜씨 좋게 포박하는 수련을 늘 쌓았다. 단지 큰 사건인 경우 사스마타(刺股, 막대기에 U자 모양의 쇠를 달아 범인의 목을 누름)나 사다리를 동원했다.
메아카시(目明し = 岡引き)는 도우신이 사적으로 고용하는 조사보조원에 지나지 않아 정보제공만 하는 것이 본분이나 흔히 체포에 가담했다.
무사봉공인(武家奉公人)
무사가 고용한 사람. 신분에 따라 와카토우(若党), 츄우겐(中間), 코모노등이 있다. 와카토우는 이들중 무사 신분인 자를 말하고 두 자루의 칼을 찼다. 츄우겐은 창이나 하사미바코(挟箱, 의복등을 넣어 막대기로 꿰어 하인에게 지게 하던 상자)등 주인의 도구를 들었고 코모노는 주인의 짚신을 들고 따라다니는등 무사의 신분이 아니다. 가령 300석의 무사라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을 10명정도 고용하는 것이 규정이었다. 무사가 공무로 마을을 걸어갈 때는 필히 도구함을 든 츄우겐과 짚신을 든 코모노를 대동했다.
메아카시
오캇비키라고도 불렀지만 이는 경멸적인 뜻으로 사용되었다. (헉, 이게 또 사실이라면 마치오 센세와나....도련님 동심에서 분치를 계속 이렇게 불렀는데) 마치부교쇼의 범죄수사는 도우신만으로 구성된 산마와리가 맡았는데 남북을 합해도 30명정도뿐이었다. 하지만 도우신이 사적으로 고용한 메아카시와 그 부하인 시탓비키(下引き)가 항시 마을을 순시하고 있었다. 수당은 한달에 2分에서 1兩정도. 그러므로 메아카시는 히토야도(人宿)라는 인력알선업자등의 직업을 살린 부업을 많이 했다. 또 부교쇼의 권세를 등에 업고 부정한 사건관계자를 등쳐먹기도 했다. 오캇비키로는 제니가타 헤이지(銭形平次)가 유명하나 실존인물은 아니다.
소방서(火消し)
목재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에도는 화재다발도시였기에 막부는 소방조직의 창설과 운용에 힘썼다. 당시는 물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부수어서 불이 퍼지는 것을 막는 파괴소방이었다. 고로 건설현장의 인부들이 소방인력을 겸했다. 그들은 가부키나 우키에요에 등장하는 서민들의 히어로였다. 특히 카가번 마에다가의 카가토비와 소방서 소속인 가엔(臥煙)이 유명하다. 공명심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도 많았다.
시라스(白洲)
마치부교쇼에서 부교가 재판을 하는 넓은 공간을 바라보는 마당에는 하얀 쟈리(砂利、작은 돌에 모래가 섞인 것)를 깔아놓았기에 이를 시라스라 불렀다, 재판장의 결백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용의자가 평민이면 거적위에 앉히고 무사나 승려면 판 위에 앉혔다. 시라스는 재판을 행하는 상징적인 장소였기에 부교쇼뿐 아니라 대관소나 관소에도 설치되어있었다. 옆에는 체포 3신기(ㅋㅋ)인 츠키보우(突棒 T자형의 쇠붙이에 못을 붙이고 긴 나무 자루를 달아 범인의 소매를 휘감아 넘어뜨림), 사스마타, 소데가라미(긴 자루 끝에 가시가 달린 여러 가닥의 갈고리를 달아 범인의 소매를 휘감아 넘어뜨림)를 세워놓았다.
감옥(牢屋敷)
에도시대의 감옥은 구치소나 유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로 형사 사건의 미결수를 수감하는 시설이었다. 서민을 수용하는 大牢, 무숙자를 위한 二間牢, 무사나 승려를 위한 揚屋, 百姓牢가 있었다. 관리는 요리키격인 牢屋奉行의 이시데타테와키(石出帶脇)가 감옥안에 집을 짓고 세습으로 근무했다. 그 휘하에는 로야도우신과 게난(下男, 하인)이 있고 츠지반(辻番, 초소경비원), 의사도 있었는데 이런 막부관리조직외에 수감자들중에 12인의 牢內役人(또는 타카모리야쿠닌高盛役人이라고도 함)을 두는 것이 허가되어 그들에 의한 자치가 이루어졌다. 그 우두머리가 로우나누시(牢名主)로, 시대극에는 다다미를 10장정도 깔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흔히 묘사된다. 그들에게 바치는 돈에 의해 대우가 달라져 돈을 내지않으면 린치를 당했다.
100대 때리기(百敲き)
8대장군 요시무네때 손가락 자르기나 코귀 깎기등의 형벌대신 받는 벌. 사용되는 것은 봉이 아니라 죽편을 2자루 가죽으로 묶고 종이밧줄로 감아 채찍처럼 만든 것이다. 軽敲き는 50대, 重敲き는 100대로 때리는 장소는 감옥문앞으로 본보기의 의미가 있었다. 감옥 관리들이 입회하였고 하인이 때리는 역과 횟수 세는 역을 맡았는데 등뼈는 때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기절할 정도로 때리지도 않았다. 중형의 경우 50대를 때리고 입회한 의사가 정신차리는 약을 먹이고(기절할 때까지는 안 때린다며!) 물을 입에 머금게하고 쉬게한 다음 때리는 역을 교대한다. 수를 잘못 세면 벌을 받기때문에 수를 세는 역은 때리는 역이 모르고 더 때리려고 할 때에는 자신의 몸을 날려 채찍을 막았다고 한다. 이렇게 횟수에 대해서는 엄밀했으나 큰소리로 아파 울면 떄리는 역이 저도 모르게 힘을 줄이게 되므로 큰소리로 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레즈미(入墨)
주로 절도범에게 내리는 벌. 팔에 폭 3분(약 9mm)정도의 줄을 2개 먹으로 넣는다. 번에 따라서는 얼굴에 넣기도 했다. 어떤 형태로 어디에 새겼는가에 따라 어디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가 알 수 있었다. 채색한 것은 시세이(刺青)라고 하지 이레즈미라고는 하지 않는다.
하수인(게슈닌 下手人)
사적인 욕심과 관계없는 싸움이나 말다툼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처해지는 참수형. 死罪도 참수형이나 이는 사리사욕에 관계된 범죄에 관계된 것이고 목을 자르는 것뿐 아니라 시체는 타메시기리(様斬り 칼이 잘 드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베는 일)에 쓰였다. 하수인은 본래 손을 써서 사람을 죽인 자라는 의미로 살인자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지므로 하수인이라는 말이 사형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거리 돌기(市中引き回し)
死罪, 고쿠몬(獄門 효수), 카자이(火罪 화형), 하리츠케(磔 기둥에 묶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 노코기리비키(鋸引き 톱으로 목을 써는 형)시 추가되는 벌. 형 집행전에 죄의 내용을 쓴 종이잉어와 팻말을 게시하고 죄인을 말에 묶고 체포도구들과 함께 에도 거리를 돌았다. 구경거리가 되어 본보기의 의미가 있었으나 죄인에게는 에도를 최후로 봐두는 기회로 여겨 기꺼워했다고도 한다. (설마..)
막부는 사회질서를 유지해야하는 입장이었기에 범죄란 '막부의 위신에 흠집을 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줄 때에는 본보기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죄(시자이)
사형을 말함. 정확하게는 참수한 뒤 타메시기리에 사용되는 것까지이고 단순한 참수는 게슈닌이라고 불렀다. 에도시대에 사죄는 아주 흔한 일로 절도에서도 10량을 훔치면 사죄가 되었다. 통상은 참수로 죄의 종류나 중함에 따라 노코기리비키(주인을 죽인 죄일 경우로 대나무로 만든 톱으로 머리를 자름), 카자이(화형으로 방화범에 적용), 하리츠케등이 있었다.
세이바이(成敗)라고 하면 통상은 참수를 말했다. 목을 자르는 장소를 도탄바(土壇場)라고 하였다. (이런 유래에서 결단을 내려야하는 시점을 도탄바라고 하는듯) 사죄를 받은 자의 유해는 장례를 치르지못하고 방기되었다. 고쿠몬은 사죄의 추가형벌로 목을 小塚原 또는 鈴ケ森 형장에 3일간 매달아 놓았다.
타메시기리
새로이 제작한 장군의 도검의 베는 맛을 시험해보는 것으로 미리 장군가의 도검을 관리하는 코시모노부교(腰物奉行)가 마치부교에게 통보를 하였다. 담당직책인 公儀御様御用을 맡은 야마다 아사에몬(山田浅右衛門 대대로 타메시기리를 맡아온 야마다 가문의 당주가 내거는 이름)이 시험하였다. 흙단을 쌓고 그 위에 시체를 얹어놓은 다음 크게 휘둘러 베는 것을 반복하였다.목을 자르는 것은 도우신의 몫인데 익숙하지 않은 도우신은 아사에몬에게 대행시켰다. 머리를 자르는 역할은 금 2分이 지급되는데 아사에몬에게 부탁하면 아사에몬으로부터도 사례금이 나왔다. 이것은 아사에몬이 다이묘나 하타모토에게 타메시기리를 부탁받고 있기때문에 그 사례금중에서 떼어 도우신에게 사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근 부탁해야겠네, 카르마도 안깎이고 돈도 더 받고)
할복(셋부쿠 切腹)
무가가 죄를 범하면 받는 형벌이나 이념적으로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죽는 것으로 되어 가문을 상속시키는 것을 허락받는 일이 많았다. 하타모토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확정되면 로쥬로부터 封書御尋라고 하는 문서가 온다. 이것을 보고 자택에서 할복하면 죄는 없는 것으로 되었다. 그라나 모르는 일이라고 답하면 무사들의 구치소인 아가리야에 갇히고 음독자살을 강요받았다. 번사등의 배신(신하의 신하)이 에도에서 살인을 하면 마치부교가 재판하고 해당 번에 인도한다. 그 때 참수를 명하기도 하지만 번이 할복으로 처리하겠다고 청하면 허락되었다.
7.에도의 무술
3대 도장
호쿠신 잇토류(北辰一刀流) 치바 슈우사쿠(千葉周作)의 겐부칸(玄武官),
신도 무넨류(神道無念流) 사이토 야쿠로(斉藤弥九郎)의 렌베이칸(錬兵館),
쿄우신 메이지류(鏡新明智流) 모모노이 슌조(桃井春蔵)의 시가쿠칸(士学館)의 세 도장을 말함.'
'技는 치바, 力은 사이토, 位는 모모노이'라고 세간에서는 평했다.
시바 료타로의 용마가 간다에 사카모토 료마가 카츠라 코로로와 도장간 시합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은 각각 호쿠신 잇토류와 신도 무넨류에 속했다.
병학
군대를 움직이는 방법을 고찰하는 학문. 싸움이 없어진 에도시대에 체계화된 것을 병학이라고 하고 그 이전의 것을 병법이라고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국시대에 甲州流, 越後流, 長沼流, 北条流등이 성립되었다.
검술/병법
에도시대 초기에는 검술이 병법에 포함되었다. 검술로 전국을 여행하는 무예자를 병법자라고도 했다. 검의 기술과 도를 가르치는 책으로 집대성한 것이 장군검술사범인 야규 무네노리의 '兵法家伝書'이다. 여기에 따르면 활, 칼, 창등을 兵이라고 하고 병은 사람을 죽이는 좋지않은 것이지만 한 사람의 악을 죽여서 만명을 살리기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을 殺人刀라 한다. 간류섬에서 사사키 고지로와의 시합으로 유명한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오륜서는 두 개의 칼을 사용하는 二天一流를 논하는데, 자세와 시선, 칼 잡는 법, 발 놀림, 쳐들어가는 방법등을 해설하고 있다.
8.사무라이와 낭인
무사/사무라이
헤이안시대 후기에 생겨나서 전투를 임무로 하는자. 무사는 전투를 담당하는 직능적 신분이었으나 가마쿠라시대 이후 무사가 정권을 쥐면서 지배계급으로서 정치도 담당하게 되었다. 에도시대에는 위로는 장군으로부터 아래로는 도보로 종군하는 카치(徒士)까지를 포함한 개념이었다. 크고 작은 칼을 차는 것으로 그 신분을 나타내어 통상은 주군을 모시고 지행으로서 영지를 받거나 봉록으로 쌀을 받았다. 사무라이는 원래 귀인을 모시는 자라는 의미로 귀족을 호위하는 병사를 호칭했으나 무사와 동의한 의미로 씌였다. 히데요시의 신분법령에는 사무라이는 최하층의 무사신분이었으나 에도시대 초기에는 다이묘중에서도 자신을 사무라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어서 사무라이라는 말만으로는 그 신분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에도시대는 신분제 사회이기에 무사와 농민, 상인 신분간에는 깊은 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무사와 그외 신분과의 경계는 애매하여 농민의 자제가 대관소에 근무하며 무사신분이 되거나 상인이 御家人株를 사서 막신의 말단으로 진입하는 일이 그리 드문 것은 아니었다.
키리스테고멘(斬り捨て御免)
키리스테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고나서 끝장을 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본래 무사가 결투를 하면 이긴 쪽이 상대를 끝장내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렇지 않으면 겁쟁이 무사로 여겨졌다.
키리스테고멘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상인을 베고 그대로 가버린다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끝장을 보지 않으면 베어진 상인은 치료를 받아 살아나기도 했다.
에도시대의 무사는 무례한 상인을 베고 그냥 가버려도 이류가 있으면 죄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면 엄청난 일이 되어버린다.
가령 아사쿠사에서 馬子(말을 부리는 운송업자)와 트러블이 생겨서 베고 가버렸던 쵸슈(長州)번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붙들려 마치부교쇼에 인도되었다. 그 번사는 마치부교에게 이러저러한 변명을 했지만 부교의 말은 "당신은 사람을 죽이고서 아직도 살고 싶은가?"였다. 결국 그는 자신의 번에 인도되면서 '할복을 시킬 것'이라는 의견서를 첨부받았다고 한다.
말/창
무사의 신분은 어떤 장비를 지니고 전장에 나가느냐로 분류된다.
잇키야쿠(一騎役)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말을 타고 몇명의 부하를 대동하고 출정하는 기마무사로 지행이 200~300석이 최저선이었다. 300석 지행의 무사는 6할 정도를 거두어 180석이 본인의 연수입이었다.
야리히토스지노케(鑓一筋の家)라고 하면 부하에게 창을 들리고 전장에 나가는 신분으로 기마보다는 낮고 100석급으로 중급무사이다.
낭인(로우닌 浪人)
주군을 갖지 않은 무사. 원래 牢人이라 썼다. 牢籠란 영지나 지위 녹봉을 잃는 일을 말하며 이런 처지에 놓인 자를 牢人이라고 했다. 에도시데에는 牢자가 牢獄을 연상시킨다 하여 浪으로 바꿔썼다. 에도시대 초기에는 다이묘의 개역을 빈번히 실행했기에 낭인이 많이 생겨났다.
낭인이 증가하자 사회불안이 커졌고 1651년 유이 쇼셋츠(由井正雪)의 난은 낭인을 주체로 한 반란계획이었다. 이를 계기로 막부는 末期養子禁令(후계자가 없는 다이묘가 죽기 직전에 양자를 들이는 것을 금지한 법)을 완화하고 개역도 줄이는 노력을 하는 한편 에도의 낭인조사를 강화했다.
18세기후반이후의 낭인중에는 재능이 있어서 발명이나 산물 개발을 한 히라가 겐나이, 글쓰기로 생계를 유지한 타키자와 바킹같은 문화인도 있었다. 이 기시에는 재능이 있는 자는 하급 무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휴가를 얻거나 번을 이탈하여 시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리한 시대였다.
가부키모노
에도시대 초기 특이한 패션으로 도시를 횡행한 무뢰한들. 가부키란 상궤를 이탈한 정신이나 행동을 말하는 가부쿠(傾く)라는 동사가 변한 말로 傾奇라고도 썼다. 세키가하라전투 이후 토요토미정권의 지배력이 약화된 쿄토에서 유행했다. 에도로도 퍼져서 하타모토야츠코(旗本奴 하타모토의 고용인)와 마치야츠코의 대립을 낳아 일종의 사회현상이 되었다.
사카야키(月代)를 깎지않고 総髪(머리를 올백해서 묶은 머리)을 하고 가발을 붙이고 빌로드 소매를 달고 화려한 색채의 옷을 입고 주홍빛 칼집을 차서 척 보면 알 수 있었다. 전국시대적인 하극상의 논리를 지지하여 반체제적인 존재였고 주종관계보다 가부키모노끼리의 수평적 연대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안정되면서 단순한 무뢰배들로 전락하였고 4대 이에츠나 정권기에 막부가 엄히 탄압하여 소멸되어갔다.
츠지기리(辻切り)
노상에서 사람을 베는 일. 에도시대 초기에는 밤에 무사가 칼이 잘드나 보기 위해 일반인을 베는 풍습이 있었다. 3대 이에미츠때에는 장군이 되지못한 동생 스루가다이나곤 타다나가가 츠지기리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진위야 어쨋던 츠지기리가 드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를 막기위해 마을 입구에 기도(木戸 나이트 기도가 아니라)를 설치하고 기도반을 두어 경비했다. 이는 현재의 交番의 유래가 되었다.
9.닌자, 밀정, 오니와방
닌자 ~ 기원은 산악기습부대
전국시대에 다이묘들의 첩보활동을 담당했던 것은 슷파(すっぱ, 水波 또는 透波라고도 함)였다. 이들은 오우미, 미노지역출신의 산적, 도둑무리들이었는데 다이묘로부터 녹을 받고 척후나 야간암살, 방화등의 기습부대로서 전장에 출몰했다.
토요토미의 오다와라 공격이래 슷파는 자취를 감추었고 닌자가 등장했다.
닌자는 이가류, 코가류라고 하는 유파에서 보여지듯이 영록산 일대에 생겨난 산악기습부대이다. 이 지역은 다이묘의 지배하에 놓여있지는 않았으나 지역무사들에 의해 전투가 활발히 일어났다. 이를 통해 갈고 닦여진 것이 닌술이다. 닌자는 늘 신체를 단련하고 손자등의 병법을 공부하며 닌술을 익혔다.
에도막부가 들어서자 이가와 코가의 닌자들은 막부에 의해 통제되어 인술의 기술도 쇠퇴해져갔다. 그러나 가부키에 인술에 관한 내용이 상연되자 닌자를 자칭하는 자들이 등장하며 속임수같은 인법을 연출하므로서 서민들의 갈채를 받기도 했다. 근대에 들어서 강담의 세계에서 닌자는 인기인이 되어 1911~1923년에 걸쳐 인기를 얻은 강담본 시리즈 '타츠카와 문고(立川文庫)에서는 실제론 불가능한 인법으로 싸우는 닌자상이 묘사되어있다.
이가닌자(伊賀者) ~ 자살 직전의 이에야스를 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의 미에현 이가의 지방 무사를 뿌리로 둔 닌자들의 총칭. 에도의 코우지쵸(麹町), 계속해서 미타니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오오쿠의 경비를 담당하는 오히로시키 이가모노, 빈 저택을 지키는 고요우아키야시키방이가모노(御用明屋敷番伊賀者), 토목공사현장의 순찰을 담당하는 코부신가타이가모노(小普請方伊賀者)등으로 나누었다. 에도성 뒤쪽의 한죠몬은 핫토리 한죠의 저택이 있었기에 붙은 이름으로 그들은 집단거주체제를 계속 유지하였다.
코가닌자(甲賀者) ~ 토요토미의 미움을 사 도쿠가와에게 접근
지금의 시가현 오우미의 지방무사를 뿌리로 둔 닌자들의 총칭. 이에야스는 이마가와가로부터 독립할 때 코가의 지방무사들을 불러 기습을 하는등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1584년 토요토미와 코마-나가쿠테 싸움에서도 코가는 참전했다. 토요토미는 이를 괘씸히 여겨 기주의 太田城 공격후 코가의 영지를 빼앗고 추방했다. 그로 인해 코가는 이에야스에게 접근했다. 세키가하라 전투 전야에 이시다 미츠나리가 후시미성을 공격할 때 코가 무리들이 원병으로 갔다가 70여명이 전사했다. 이에야스는 그들의 후손을 불러들여 야마오카 카게토모를 두령으로 삼고 요리키를 10명 도우신을 100명으로 한 코가組를 창설했다. 코가조는 에도성 대수문, 하승문, 가운데문의 대수 3문의 경비외에 성내의 경비도 맡았다. 현재에도 황거 동어원에 남아있는 백인초소는 코가조의 것이다. 코가조의 거주지는 확실치않으나 처음에는 이가조와 마찬가지로 코우지쵸 1번 마을의 남쪽 코가자카 근처에 있었으나 그후 아오야마 (지금의 신주쿠구 카스미가오카 부근)로 옮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술(忍術)
닌자는 야간활동이 많았으므로 방향을 알기 위해 별자리 연구, 고양이의 눈으로 시각을 가늠하는 방법등 경험과학적 방법을 배웠다. 내륙교통의 동맥인 하천으로 이동하기위해 잠입船을 고안한다던가 해자의 물속에 잠수하는 방법, 높은 해자를 넘어가는 방법등을 연구하였다. 게다가 폭약의 사용법, 만능약이나 휴대식량등도 고안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과학적인 사고에 기초했기때문에 폭발과 함께 자취를 감춘다던지 천정에 들러붙는다던지 하는 있을 수 없는 인술은 말할 가치도 없다. 그러나 가부키 '天竺徳兵衛韓噺'같이 인술을 가미한 공연이 인기를 얻어 무대위에서 자유자재로 현란한 인술이 연출되고 닌자를 자칭하는 기술사도 등장했다. 이렇게 인술이 오해되어가서 강담에 이르러서는 황당무계한 인술이 횡행하게 되었다.
쿠노이치(クノ一) ~ 닌자에 여자는 없다! 인술의 예외중의 예외
일반인들에게 여닌자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닌자가 금기시하는 女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않기 위해 만들어진 은어다. 닌자는 술, 색, 욕심을 엄금하고 忍의 기본은 正心에 두었다. 즉 인술은 주군을 위해 천하를 위해 행하는 것이 허락된 것이었다. 따라서 닌자무리에 기본적으로 여자는 없고 여색도 엄금할 수 밖에 없었다. 1676년에 지어진 인술의 고전적 비전서인 반센슈카이(万川集海) 8권 陽忍篇에 '쿠노이치'의 술법이라는 비전이 적혀있다. ['3자를 1자로 하는 자'를 닌자로 만들 것]이라고 써있는데 女자를 피하면서 여자를 첩자로 이용하는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오니와방(御庭番) ~ 장군 직속의 최강 밀정으로 하시모토로 승진하기도
8대 요시무네가 출신지인 기주번에서 데리고 온 철포 탄약 관리를 담당하는 10석의 쿠스리코미야쿠(薬込役 탄약을 끼워넣는 일을 맡은 무사)와 5석의 말재갈잡이등의 하급무사로 에도성 정원의 경비를 맡았기에 오니와방이라고 칭했다. 처음엔 17개 가문이었고 에도시대 후기에는 21개 가문으로 늘었다. 신분상으로는 오히로야시키이가모노로 되어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가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막부말기까지 존속했다.
그저 그늘의 존재만이었던 것이 아니라 장군알현가능 직위로 올라간 가문도 생겨나 700석의 난도카시라나 500석의 칸죠긴미야쿠에 승진한 자도 있었다
10.외국과의 관계
쇄국(사코쿠)
3대 이에미츠까지는 크리스트교 금령, 막부에 따른 무역통제, 일본인의 해외항해 금지등이 실시되어 쇄국되어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633~39년에 발표된 쇄국령으로 포르투갈인이 추방되어 일본인들은 외국인과의 접촉이 끊겼으나, 오란다와 중국과는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허가받았고 조선과는 쓰시마번을 중개로 국교가 있고 류큐는 사츠마번의 지배하에 있었다.또 마츠마에번은 아이누 민족과 교역을 하고 있었다. 이 나가사키, 쓰시마,사츠마, 마츠마에 4개의 입이 외국에 열려있어서 쇄국은 아니었다고 하는 학자도 있다.
원래 쇄국이라고 하는 말은 1801년 Engelbert Kampfer(a움라우트)의 저서 '일본지'의 일부를 번역한 오란다 통역사 시즈키타다오가 쇄국론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때문에 유래된 것으로 그때까지는 쇄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 오란다와 중국과는 통상국으로 인식하여 국교가 없었고 조선과 류큐는 통산국으로 인식하여 국교를 트고 있었다.
흑선
아즈치모모야마시대에 내항한 포르투갈 군함은 목조였던 선체의 부식을 막기위해 검은 타르를 칠했기때문에 일본에서는 유럽의 대형선을 흑선이라고 불렀다. 1647년 국교회복을 원하는 포르투갈의 군함 2척이 나가사키에 들어오자 막부는 긴장하여 서국대명에게 많은 군함을 동원하여 나가사키만을 봉쇄하게하였다. 이 '텐보4년흑선내항'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각종의 그림들에 묘사되어있다. 1853년 미국 사절 매튜 페리의 함대 4척이 우라가에 내항. 다음해에는 7척이 에도에 모습을 드러냈다. 페리 함대도 역시 함체가 검게 칠해져 있어서 흑선이라고 불렸다.
에도서민들은 거대한 흑선이 연기를 토하며 항해하는 광경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다. 이후 '흑선내항'이라고 하면 페리함대 내항을 가리켰다. 최초에 페리가 왔을 때 증기선은 기함 Susquehanna호등의 2척이었고 나머지는 범선이었다. 증기선도 보통 항해시에는 돛의 힘으로 움직였다.
조선통신사
에도시대에는 12회 내일했다. 1607년의 첫 사절은 조선출병후 국교회복을 위한 것이었고 스시마번의 노력으로 실현되었다. 3대 이에미츠때에는 조선이 청에게 압박을 받고 있었기에 일본과의 우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4대 이에츠나이후로는 장군이 바뀔 때마다 축하의 의미로 방문했다. 사절은 500명정도의 구성으로 국서와 예단을 지참했고 일본내의 경비는 모두 일본측이 부담했다. 사절의 正使로는 후일 일본의 총리대신격인 영의정이 될 엘리트 관료가 선택되어 일류의 학자와 화가가 수행했다. 일본의 유학자는 사절과 시문을 주고받으며 문화적인 교류를 하고 민중들은 사절단의 행렬을 구경하러 운집했다.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조선의 사절이 오는 것뿐의 반쪽 외교로 막부는 무역도 하고 있지 않았으나 쓰시마번은 조선과의 국교를 담당하는 번으로서 부산에 왜관이라고 부르는 시설을 짓고 일상적으로 무역을 했다. 11대 장군의 축하사절은 막부의 재정난으로 인해 쓰시마까지만 오고 이후 계획은 있었으나 통신사가 일본에 오는 일은 없었다.
바테렌
크리스트교 선교사. 포르투갈어 padre가 伴天連이라고 표기하고 이를 일본어 읽기로 읽은 것. 크리스트교인 사이에는 Pe라고 썼다. 사제에 서품되지 않은 수도사는 이루만(irumao)라고 한다. 일본에 온 선교사가 속한 수도회는 포르투갈계의 예수회, 스페인계의 프란시스코회, 도미니크회, 아우구스티노회등이었다. 이중 최대의 조직은 Fransisco Xavier이래 포교에 종사한 예수회이다.
1587년 큐슈를 평정한 히데요시는 나가사키 땅이 예수회에 기증된 것을 알고 바테렌 추방령을 내렸다. 이떄문에 바테렌들은 큐슈를 중심으로 각지에 잠복하게 되었다. 예수회는 히데요시를 자극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새로이 포교에 참가한 스페인계 수도사들은 활발한 행동을 취했기에 1596년의 '26성인 순교'같은 사건도 일어났다. 에도막부의 성립이후 금교령은 강화되어 바테렌과 신자들에게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3대 장군대에 이르러서는 바테렌은 일본으로부터 소멸되었다.
대지마
나가사키에 설치된 인공섬으로 외국인 거류지였다. 일본어로는 데지마, 데시마라고 하나 외국의 기록에는 데시마로 되어있다.
11.에도의 생활
雪隱(せっちん 셋칭) ~ 배설물로 한몫잡자
변소, 카와야라고도 한다. 에도시대 전기에는 강변이나 하수의 위에 작은 집을 지어 변소로 쓰는 일이 많았다. 배설물이 바로 흘러가버리는 구조로 폐기과정이 생략되어 있었다. (헐,,그 오염이란..) 이후 법으로 금지되긴 했지만 분뇨가 농작물 재배에 좋다는 것을 알게되자 농민들에게 팔아넘기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長屋(오늘날의 연립주택같은 서민 거주지)의 각방에 변소를 만들지 않고 공동변소를 만들어 분뇨 판매 수입을 집주인이 챙겼다. 에도 근교 농촌에서 야채작물의 재배가 번성하자 똥값도 올라서 농부들의 경영에 압박을 줄 정도였다고 한다.
千兩箱(せんりょうばこ 센료바코) ~ 지붕위로 도망가는 것은 무리
금화를 수납하기위한 상자. 실제로는 500량들이, 2000량들이 상자도 있었다고 한다. 코방(小判, 타원형의 납짝한 금화)은 원래 18그램이었으나 후일 13그램이 되어 1000장이면 13킬로그램, 상자의 무게까지 합치면 17킬로정도 되므로 TV시대극에 잘 나오는 것처럼 옆구리에 천량상자를 끼고 지붕위로 뛰어다니는 일은 어려웠다. 에도시대의 유명한 도둑 네즈미코조 지로키치(鼠小僧次郞吉)는 무사저택에 잠입하여 마루밑에 숨어있다가 20량, 50량 정도의 금화를 훔쳐내는 정도였다.
오하구로(お歯黒) ~ 냄새가 구리지만 이유는 납득
기혼여성이 치아에 했던 검은 화장. 카네(鉄漿)라고도 한다. 식초, 술, 쌀뜨물에 못을 담궈 만든 치흑수와 탄닌이 주성분인 五倍子粉을 붓으로 치아에 여러번 칠했다. 냄새가 아주 구려서 아침에 집안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했다고 한다. 흑색은 다른 색에 물들지 않으므로 정숙한 여자의 증표를 나타내는 관습으로 자리잡았다. 막부말기에 외국인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 처녀들은 아주 귀여운데 결혼하면 추해진다."고 평판이 났다. 미국 사절 매튜 페리도 "이 관습이 부부간의 행복에 공헌하지는 않는 것같다고 우리들은 생각한다. 키스는 구혼시대에 끝나버리지 않겠는가."하고 부정적으로 쓰고있다. 메이지시대에 들어오면서 외국에 대한 배려때문인지 오하구로는 금지되었다. 덧붙이자면, 서민 여성들은 아이를 출산하면 눈썹을 밀었다.
인롱(印籠 인로) ~코몬님이 인롱을 보여줘도 아무도 엎드리지 않는다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약통. 약롱이라고도 한다. 뚜껑과 본체(3중 또는 5중으로 된 것이 많음)에 구멍을 내어 끈을 달고 그 끝에는 허리춤에 꽂았을 때 빠지지 않게 끈 끝에 장식물인 네츠케(根付け)를 달았다. 겐로쿠시대에 들어서는 무사의 패션으로 자리잡았다. TV 드라마 "미토코몬(水戸黃門)"에서 미토번 은거 도쿠가와 미츠쿠니의 가신 스케상과 카쿠상이 아오이 문장이 새겨진 인롱을 내미는 장면이 익숙하지만 초기의 미토가문에는 인롱을 쓰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갖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사품이라고 여겼지 코몬 본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에도의 목욕
센토우(銭湯) ~ 남탕과 여탕의 구별은 없었다
유료 목욕탕은 관동에서는 湯屋, 관서에서는 風呂屋라고 한다. 이에야스가 에도에 들어온 다음해에 이미 유료 목욕탕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이는 이세 출신의 요이치라는 자로 현재의 洗い湯가 아닌 이세식의 蒸し風呂였다. (아마 물받아 놓은 탕이 아니라 증기탕이었다는 말인듯. 사전에도 없는 말이라...) 남녀탕의 구분은 원래 없이 入込湯라 하여 혼욕이었으나 1791년 노중 마츠다이라 사다노부가 혼욕을 금지하여 남탕과 여탕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이 사람 욕 좀 꽤나 먹었겠구먼...) 하지만 그후에도 혼탕이 한물 간 것은 아니었다. (그럼 그렇지) 1808년 조사에 따르면 남탕이 141개소, 여탕이 11개소, 혼탕이 371개소였다.
요리키의 아침 목욕(与力 오늘날의 경찰에 해당) ~ 핫쵸보리(경찰들이 모여 살던 동네)의 목욕탕에는 여탕에도 칼걸이가
목욕탕은 동이 트면 영업을 시작하였다. 도박장이나 유곽에 갔던 사람들이 입장하면서 혼잡해진다. 은거상태인 사람들이나 의사, 스님, 하급 무사들이 들어온다. 상상이상으로 오전 손님들이 많았다. 한편 여탕에는 여자들이 가사일로 바쁘기 때문에 거의 사람이 없었다. 여기에 요리키나 도신(요리키의 부하)들이 들어간다. 남탕에서 들려오는 대화와 소문에서 범죄의 냄새를 맡기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위를 이용한 특권누리기였을 것이다. 여탕에도 칼걸이가 있어서 핫쵸보리의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그들의 칼걸이였다.
유나부로(湯女風呂) ~ 무사저택 주위의 목욕탕은 요시와라를 위협했다
에도에 목욕탕이 생기고 얼마 안되어 목욕탕에 여자를 두는 유나부로라는 것이 생겨났다. 입욕료는 20문 (일반 목욕탕은 1문), 탕녀는 2,30명 정도 있어서 손님이 목욕하러 오면 등을 밀어주거나 머리를 감겨주고 목욕탕에서 나오면 차를 내오고 이야기 상대를 해준다. 탕녀는 실질적으로는 유녀(기생)와 같아서 목욕탕에 손님을 뺏긴 요시와라(에도 유일의 공창)는 쇠퇴하여 유녀를 유나부로에 파견하여 일하게 하는 일마저 생겨났다. 1657년 막부는 유나부로를 금지하고 탕녀들은 요시와라로 보내졌다.. (땅끝에서 사랑을 노래하더니 아사쿠사로 보내져버렸군)
목욕료(湯銭) ~ 서민의 친구인 저가격은 막부의 통제덕분
목욕탕은 생활면에서도 보건위생면에서도 서민들에게는 불가결한 요소였기에 오랫동안 저가격으로 묶여있었다. 처음에 영락통보 1문으로 시작한 입욕료는 150년간 어른 6문, 어린이 4문으로 유지되었고 이후 변동이 있었으나 여전히 다른 물가에 비하면 싼 것이었다.
산스케(三助) ~ 모두 독립을 꿈꾸며 일했다
목욕탕의 때밀이 남자들을 말한다. 남탕이고 여탕이고 출입이 자유로왔고 손님이 탕에서 나오면 누카부쿠로(糠袋;겨를 넣은 주머니)로 등을 잘 밀어주고 물을 끼얹은 다음 가볍게 마사지해주고 2,3회 팡팡!하고 기세 좋게 등을 두드린다. 이것이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모양으로, 이 소리로 팁의 액수가 달라졌다. 떄밀이가 되려면 땔감지기에서부터 가마솥당번, 탕에서 나올때 끼얹는 오카유(岡湯)를 퍼올리는 유쿠미방등의 경험이 필요해서 10년은 걸렸다. 이들은 거의 에치젠, 엣츄, 에치고등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출신으로 몸가짐이 단정하고 저축을 많이 했다. (겐신의 영향인가?) 급료외에 팁을 모아 목욕탕을 차리는 독립을 꿈꾸었는데 당시 목욕탕 영업권은 300량을 넘어서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온천 ~ 비용은 보통 3주에 1량으로 서민들에게는 고가
온천은 병을 치료하는 시설로 발달하였다. 에도에서는 하코네가 비교적 가까운 치료온천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야스가 병을 치료하기위해 갔던 아타미(熱海)의 탕, 살균력이 강해 매독등의 성병에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 쿠사즈(草律)의 탕등에도 많은 손님이 몰렸다. 온천치료는 보통 3회 순례가 일반적이었다. 1회가 1주간으로 총 3주가 된다. 하루에도 몇번씩 탕에 들어가 치료를 한다. 숙박비는 1회순례에 200문정도로 쌌지만 이불사용료가 250문, 온천행 가마비와 식사비등을 합치면 1량을 넘어 유복하지 않고는 가기 힘들었다. 다이묘들은 병에 걸리면 막부의 허가를 얻어 온천에 갔는데 이들은 온천 하나를 전세를 내서 많은 가신들도 데리고 갔으므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은거(隠居) ~ 무사의 은거는 상당히 성가시다
가독을 넘겨주고 세대교체를 하는 일을 말함. 병으로 인한 은거는 40세 이상, 노쇠은거는 7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관행이 있었다. 물론 70세가 넘어도 근무하는 무사들도 많았다.
미쿠다리항(三下り半, 이혼장) ~ 실은 여성의 지위는 높았다
남성이 여성에게 이혼을 고하는 문서. "그쪽 분께서는 내 의지로(勝手) 이혼한다. 앞으로 누구와 결혼을 해도 자유이다."라는 것이 전형적인 문구로 半紙에 3행반으로 썼기에 이렇게 불렸다. 勝手의 제멋대로라는 뜻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낮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勝手의 '형편'이라는 뜻때문에 남성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고 남편이 싫어진 아내가 억지로 남편에게 이혼장을 쓰게한 사례도 있었기에 이혼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이 좋을듯하다. 이혼이 드문 일도 아니었고 남성의 인구가 많은 에도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불의밀통 (不義密通) ~ 불륜처와 간부를 베어버려라
불의는 남녀의 도리에 어긋난 관계를 지칭하고 밀통은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남녀가 몰래 응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합성어인 불의밀통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응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남편은 처와 상대방 남자, 즉 間夫(마부)를 살해해도 죄를 묻지 않았다. 단, 양쪽을 다 죽이지 않고 아내만을 살려주는 것을 '미련'이라고 하였다. (헐...) 처가 불의밀통을 한 사실이 소문나면 무사는 처를 죽이고, 간부가 도망간 경우에는 찾아내어 妻敵討(메가타키우치)를 하지않으면 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불의밀통이 소문나지않도록 빨리 이혼을 하거나, 간부를 죽이고 이를 도적의 소행으로 꾸민 뒤 이혼하기도 하였다. 격식을 중시하는 무사계급은 물론 그외의 계급에서도 불의밀통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였다.
에도의 음식
스시(寿司/鮨) ~ 쥐는 초밥은 포장마차에서 파는 패스트푸드였다
쥐어 만드는 초밥을 에도마에스시(江戸前鮨)라고 한다. 식초를 섞은 밥에 생선의 살을 날것으로 얹은 것으로 에도의 발명품이다. 에도마에라고 하는 것은 에도 앞에 펼쳐진 바다를 말하며 에도만(灣)에서 잡히는 싱싱한 생선을 사용하였으므로 에도마에스시라는 이름이 붙었다. 횟감으로 쓰이는 것으로는 사시미외에 뱅어, 달걀, 아나고, 새끼 전어등으로 횟감과 밥 사이에 와사비를 넣는 방식등도 현재와 그다지 다르지않았다.
원래 초밥은 소금에 절인 생선을 쌀밥에 절인 보존식으로 나레즈시(熟鮨)라고 불렸다. 비파호의 명물 후나즈시(鮒鮨, 붕어 초밥)가 대표적이다. 에도시대 초기에는 절이는 기간을 짧게 한 나마나레(生熟れ) 스시가 만들어졌고 1751년경에 밥에 식초를 넣은 하야즈시(早鮨)가 탄생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스시는 상자에 식초를 섞은 밥을 넣고 위에 생선살을 놓고 눌러 만든 오시즈시(押鮨)였다. 손가락으로 쥐어서 만드는 니기리즈시(握り鮨)는 1818년경에 시작되었고 창시자는 료코쿠(両国)의 하나야 요헤(華屋与兵衛)라 한다. 김마키가 생겨난 것도 에도시대 후기이다.
그 당시의 쥐는 초밥은 포장마차에서 팔리는 패스트푸드로 가격도 쌌다. 스시 한 점에 4~8문, 달걀은 고가로 16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접대용의 고가 스시를 파는 사람도 출현하였고 그중에는 한 점에 3몬메(240문정도)~ 5몬메나 하는 스시도 있었다고 한다.
에도의 미디어
카라와방(瓦版) ~ 읽으면서 팔아서 요미우리라 불렀다
뉴스를 전달하기 위한 1,2장짜리의 인쇄물. 그림이 중심이 되었으므로 에조시(絵双紙), 파는 사람이 큰소리로 읽으면서 팔러다녔으므로 요미우리(読売)라고도 불렀다. 카와라방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막말에서 메이지 시대에 걸쳐서이다. 겐로쿠시대에 심중(心中, 연인끼리 사랑을 이루지 못하여 동반자살하는 일. 남색에서 먼저 시작됨)이 유행하면서 이를 보도하는 호색물이 범람하였다. 막부에서 심중을 금지하면서 관련하여 카라와방에도 규제를 가했다. 그 뒤부터는 충효나 화재에 관한 보도가 많아지게되었다.
노름꾼과 도박(토세닌渡世人 바쿠치博打)
협잡(いかさま)
도박의 승패는 우연에 좌우되므로 확실히 이기려면 속임수를 써야한다. 주사위 도박에서는 주사위에 장치를 하거나 항아리에 속임수를 쓰거나 마루아래에 동료를 숨겨놓고 뒷면에서 주사위를 보고 눈금을 바꾸거나 하는 やり口가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주사위의 속임수로는 5,3,1의 면에 침을 꽂아두어 항아리를 끌어올 때 나는 소리의 차이로 홀짝을 판단하는 鳴針入り, 5,3,1의 면에서 검은 가루가 나오게 하여 항아리를 끌어올 때 남는 소량의 가루로 눈금을 판별하는 粉引き, 2개의 주사위를 가는 비단끈으로 연결하여 어떻게 굴려도 홀이면 홀, 짝이면 짝이 되게하는 츠나기(都奈技)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토세닌/무슈쿠토세닌(渡世人・無宿渡世人)
서민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에 있는 절의 宗門人別改帳, 즉 인별첩에 등록되어 이것이 호적의 구실을 했다. 고향마을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면 인별첩으로부터 제외시켰다. 이것이 '무숙'이다. 渡世란 말은 생활을 의미한다. 도세인은 통상의 장사같은 일에 종사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무숙도세인은 각지의 도박패 두목에게 몸을 의탁하여 도박을 하거나 용돈을 타쓰며 생활하는 노름꾼을 가리켰으나 실제 에도시대에 이런 쓰임새로는 쓰이지않았다. 노름꾼 대부분이 무숙이고 무숙이라는게 자랑할만한 일도 아니어서 일부러 자신을 무숙도세인이라고 칭하는 일도 없었다. 이런 자들을 모델로 쓰인 사사자와 사호(笹沢佐保)저 '코가라시 몬지로(木枯し紋次郎)'는 나카무라 아츠오주연의 TV 드라마화 되어 무숙도세인의 이미지를 일반화시키는 대힛트작이 되었다. 몬지로는 10살때 집을 버리고 나와 전국을 돌아다니는 협객이 되었다. 농민출신이므로 두 자루의 칼은 못차고 와키자시(통상 차는 두 자루 중 작은 칼)를 큰 것으로 소지한다. 이것이 나가도스(長脇差)이다. 타인과 엮이는 것을 극력회피하고 자신의 솜씨 하나로 살아가려고 하는 니힐리스트 스타일은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노름꾼 두목에 기생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곤란헀다.
테키야/야시(テキヤ・香具師)
노점상. 파는 물건, 즉 네타는 특별한 구입처가 있고 노상에서 팔 때는 구경거리를 보여주거나 독특한 어조로 상품을 소개하고 교묘한 언어로 매상을 올렸다. 말하자면 영화 '남자는 괴로와'의 후텐노토라(フーテンの寅)즉 쿠루마 토라지로같은 존재였다.
테키야는 원래 향구사라고 한다. 야시라고 읽으므로 野師, 野士라고도 썼다. 野武士가 기갈을 견디기위해 약을 팔러 다닌 것이 시초라고 한다. 일설에는 약장수 행상의 원조인 야시로(弥四郎)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주로 두꺼비기름이나 치약을 팔았다. 치약을 파는 것뿐 아니라 이를 뽑아주거나 틀니를 해주기도 했다. 야시가 향구사라고 표기되는 것은 이들이 취급하는 물건을 향구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향구에는 방물, 약, 홍-백분, 담배등의 상품외에 구경거리의 흥행, 인형극, 책읽어주는 사람등의 연예인, 길거리의사등이 포함된다.
관소와 여행
오이세마이리(お伊勢参り)
미네현 이세에 있는 이세신궁에 참배하는 오이세마이리는 에도시대 서민들의 동경이었다. 17세기초에도 연간 수십만명이 참배를 했다고 추정된다. 이것을 전국에 퍼뜨린 것이 이세의 御師라고 불리는 神職이었다. 熊野신사나 富士浅間신사등에도 御師가 있었지만 이는 오시라고 발음했고 이세만은 온시라고 발음했다.
여행안내기
서민에 이르기까지 여행이 유행되어 가이드북도 다수 출판되었다. 1810년에 발간된 야스미 로안著 '여행용심집'을 보면 여행시 주의점 61가지, 소지해야할 물품, 전국의 가도및 길의 순서등을 친절하게 해설하고 있다. 가령, '여관을 선택할 때에는 잘 지은 건물이면서 북적거리는 집을 선택하고, 좀 비싸도 도움이 된다.','여관에서는 모르는 사람들과 한 방에서 자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조심하면 괜찮다.'.'도중에는 색욕을 억눌러야하는데 창녀에게는 병이 있기 쉽다'등이 있다. 또,'도중의 짐은 가능한한 가볍게 할 것','여관의 등불은 꺼지기 십상이어서 휴대용 쏘시개 나무는 필수','세탁물을 말리는데는 마로 된 망이 편리'등 얄미울 정도로 세세한 가르침들이 실려있다. 여러 가지의 안내서가 출판되어 당시 서민들의 여행열기를 엿볼 수 있다.
'역사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왕검성은 점령되었다고 볼 수 없다. 조선후 5군은 황하 강변 일부지역에 불과. (0) | 2016.04.04 |
|---|---|
| [스크랩] 여와와 복희에 관한 홍수설화 (0) | 2016.04.02 |
| 천부경 해설 (0) | 2015.06.02 |
| 영가무도 (0) | 2015.05.07 |
| 고대일본과 이스라엘10부족 (0) | 2015.04.22 |